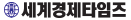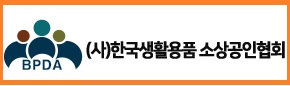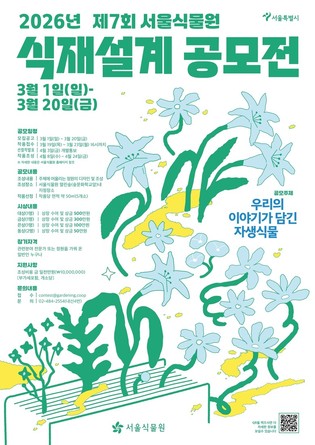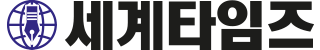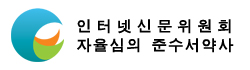|
| ▲ |
우유술(尤柔術)은 전장에서는 잡고, 던지고, 메치고, 타격하는 것을 말한다. 야나기 칸사이는 여러 곳 지방을 다니면서 진검 승부를 했다. 이러한 그는 항상 진당(眞当)을 가지고 수행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깨우친다. 그리고 야나기 칸사이는 진당(眞当)을 얻기 위해 끝없이 노력을 했다. 또한 유능강(柔能剛)을 제압하는 극의를 수년에 걸쳐 마음을 다스리어 묘술(妙術)을 얻었다. 그는 양류(兩流)와 합류하고 또 일파를 건립하여 백이십사수로 신체기법을 정하여 천신진양류(天神真揚流)이라 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유(柔)와 도(道)를 좋아했고 또 양심류(楊心流)와 진신도류(真神道流) 등 무사수행을 했다. 그리하여 그는 백유여리(百有余里)의 십여 년을 걸쳐 무사수행을 마쳤으나 몸의 깨우침을 얻기 위해 다시 무사수행의 길을 떠났다. 그는 유유(猶柔)의 의미를 스승에게 물어듣고 말년에는 모든 것을 초지일관하여 무사수행을 했다.
또한 진원(陳元)의 우당(尤唐, 중국)에서는 단지 차고 찌르는 것만이 있으며 신라삼랑원의광(新羅三郎源義光)에서 시초가 된 본토의, 즉 고류적 측면 유(柔)와 완전히 다르다. 신라명신(新羅明神)의 신(神)앞에서 유(柳)의 대설(大雪)을 하여 나무 가지에 쌓이는 눈의 마음을 가지고 양심류(楊心流) 수행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진신도류(真神道流)는 오오사카의 어성(御城) 동심(同心) 야마모토민자에몬의 원조이다. 우양심류(尤楊心流)로부터 노력하여 따로 유의(流儀)때문에 유술기법의 수형(手形)을 이루는 것이 많이 있다. 삼백(三百) 삼수(三手) 안으로부터 초단(初段), 중단(中段), 상단(上段)부로 단(段)을 정하여 육백팔(六十八) 수(手)를 극(極)하여 진신도류(真神道流)를 체득한다.
특히 무사는 유술에 대하여 깊게 생각하고 수련해야 한다. 유술에 있어서 형(形)의 수련은 활물(活物)의 의미가 있고 반대로 사물(死物)의 의미도 있다. 스승이 이를 답하고 말하되 “유술의 연습의 형(形)은 옛 선조 무사에게도 없고 또 활물(活物)에도 없다. 먼저 연습을 임하여 적(敵)이라 생각하여 위치를 잡고 전심(前心), 통심(痛心), 잔심(殘心)을 가져야 한다. 이 세 가지의 수체(守体)를 유(柔)로 하여 기해단전(氣海丹田)에 기(氣)를 납(納)하여 용기(勇氣)를 포함시켜 적(敵)의 사물(死物)이라 해도 자신의 활물(活物)이라 생각하여 본인의 일심(一心)을 가지고 수행할 때는 이것이 활물(活物)의 연습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이는 사물(死物)이라 생각하고 행할 때도 사물(死物)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선물(先物)에 예를 들어 말하면 봉(棒)을 가지고 칠 때 내 마음이 봉(棒)이 된다. 검(劍)을 가지는 무사와 있을 때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 항상 백검(白劔) 중 날고 들어가는 마음가짐으로 수행하면 상수명인(上手名人)의 자리에 이루기에 이를 노력하여 수련을 해야 한다. 다른 유파에도 의존하지 않고, 연습하기를 싫어하는 일은 무사에게 없어야 한다.
힘을 일향(一向)으로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힘이 있는 사람과 힘없는 사람 마찬가지로 상수(上手)에 이루면 같은 정점에 도달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업(業)이 아직 익숙하지 않고 힘을 사용하면 마음과 몸이 돌과 같이 된다. 유의(流儀)의 업(業)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선기(先氣)의 급(扱)과 힘의 급(扱)과의 차별이 있어야 한다. 그 업(業)을 이루는 것이 가볍고 부드럽게 하여 날씬하고 고집 없는 것을 기(氣)의 급(扱)이라 한다. 무거운 강기(剛氣)를 이루는 기(氣)를 힘의 급(扱)이기에 이를 깊게 생각하고 수행해야 한다.
당류진지위(当流眞之位)의 수합(手合)으로부터 시작하는 가르치는 마음은 어떠하겠는가! 자신 자신의 유술이 너무 지나치게 형(形)이 부드러워지거나 너무 화려하면 적(敵)의 거만함도 자기 자신의 본체로부터 봐야 한다. 적(敵)의 변화에 응하는 일이 첫 째이다.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도 던지는 것도 입신으로 들어가는 것은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 이는 밟고 멈추려고 해도 멈추지 않고 형(形)은 유(柔)로 하여 어깨를 발가락 끝에 납(納)하여 기(氣)를 붙이면 스스로 제하(臍下)가 가득 차는 것이다.
소병비력(小兵非力)의 자(者)가 강강(剛強)되는 자(者)에게 승리를 얻는 것은 강강(剛強)의 사람에 대하여 위험하게 생각하여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또한 유약(柔弱)한 사람에게 향한다고 해도 가볍게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 항상 수련하는 것은 술(術)을 가지고 적(敵)의 힘에 거역하지 않고 파도 위의 뜨는 나무와 같은 몸을 가지고 제어 할 때는 아무리 강강(剛強)라 해도 승리를 얻는 것이다.
타류(他流)와 시합(試合)을 시작할 때는 형(形)을 만들지 말고 적(敵)의 변(變)에 응(応)하여 업(業)을 해야 한다. 그리고 선각(先角)되는 것을 단단(段段) 옥(玉)과 같이 하는 가르침이다. 처음부터 정규(定規)를 정하여 가르친다고 해도 자연스럽게 절차탁마(切磋琢磨)하여 극의(極意)의 도(道)에 이루면 옥(玉)과 같이 되는 것이다. 옥(玉)은 둥글게 하여 각(角)이 없다. 둥근 것은 시작이 없고 마지막이 없다. 옥(玉)이 둥글고 원이기에 멈추는 것은 없다. 멈추지 않는 것의 마음을 가지고 천변만화천(變萬化)라 술(術)을 행하여 그 중에 납소(納所) 없으면 승리(勝利)를 얻을 수 없다. 마음은 조용하게 하여 납(納)은 기(氣)와 몸과 과격하게 마음의 조용한 것을 옥(玉)의 둥그런 것 같이 딱딱해지지 않고 멈추지 않고 굴리는 옥(玉)의 멈추는 것 같이 마음에 이루면 강강(剛強)이라 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몸이 된다.
송일훈 박사(동아시아 무예전쟁사·문화교류정책 평론가)
전)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전)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소 연구교수
현)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소 전임연구원
[저작권자ⓒ 대구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