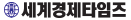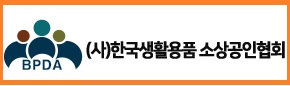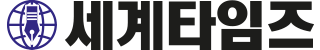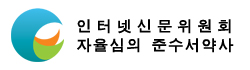|
| ▲ |
다만 명료함은 심체부동(心体不動)으로부터 생기는 것이다. 잔심(残心)이란 초심이다. 마음이 남아 명료함에 이르는 것이다. 이것이 자득이다. 이 자득을 깨달을 수 없으면 체용(体用)에는 이를 수 없다.
신의(神意)는 당류를 오체(五体)에 나눠주어 볼 때는 야화라 구미우찌(和組討 : 격투)가 당류의 마음이다 이 의미를 깊게 느껴야 하는 것이다. 사(士)는 충(忠)을 체(体)로 하고 공(功)을 용(用)로 한다. 필승의 도리를 얻어 따르면 신전(神伝)의 진도(真道)를 등지지 않는다.
오지(奥旨)는 삼략(三略)에는 유(柔 : 부드러움)는 능히 강(剛 : 굳셈)을 제어하고 유능제강(柔能制剛) 약(弱 : 약함)은 능히 강(強 : 강함)을 제어한다. 또 유(柔 : 부드러움)는 마련하는 곳이 있어 강(剛 : 굳셈)은 주는 곳이 있어 약(弱 : 약함)은 이용하는 곳이 있어 강(強 : 강함)은 더하는 곳이 있다. 이 사자(四者)를 겸하고 그것이 적당하게 끄트머리의 것을 억제하는 것이다.
초의(初意)는 원래 무가의 병술이 여러 유파는 많다고 해도 하나도 다른 것은 없다. 얕은 것보다 깊은 것에 들어가고 깊은 것보다 얕은 것에 나오는 것은 어느 길(道)에도 변하는 것이 없다. 그러나 각자 수파(水波 : 물과 물결. 이름은 달라도 본체는 같은 것을 비록이라고 말한다)의 미혹이 있다고 생각한다.
병법(兵法)의 근원은 깊다고 해도 얕은 것보다 찾아 깊은 것에 들어가는 것은 쉬워서 깊은 것보다 얕은 것에 이르러 미혹이 개이면 고인의 격언에는 있다. 벽(壁 : 장해)은 물기가 움직일 때는 랑(浪 : 파도)이라고 쓰는 것 같은 것이다. 물과 물결과는 문자에서는 매우 다르다고 해도 그 근원은 같은 물이다. 움직임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랑(浪 : 파도)이다.
중의차승(中意次蕂)은 원래 생각건대 쥐를 다스리고 싶은 사람은 고양이를 요구하고, 적(敵)을 멸하고 싶은 사람은 칠능(七能) 1에 도덕 2에 지모(지혜로운 계략) 3에 견문 4에 심강변설(心強弁舌) 5에 정직 6에 용구공달(用具功達) 7에 산감(算勘 : 점을 치고 생각하는 것)을 실제로 검사함)이 있는 대장을 요구하는 것이다. 자신을 다스리고 그 후에 나라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은 문무양도(文武両道)의 길(道)을 요구하고 문무양도(文武両道)의 길(道)이 분명한 때는 치국평천하(治国平天下 :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화롭게 하는 것)이다.
정의(正意)는 연습의 반으로 지금까지의 배우고 행하는 것은 눈과 몸과 손발의 기능이 이루어질 때까지 수업(手業 : 손기술)은 끝내고 승리는 자득이며, 자신이 결단해야 한다. 칼은 손으로 사용하지 않고 수업(手業)에 승리는 없고 이 도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사람에 이를 것은 없다.
도리의 수행이 없으면 마음의 놓아 둔 장소를 모르고 기예의 집행만으로는 마음의 미혹이 있다. 먼저 적이 움직이는 곳에 마음을 두면 그 동작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다. 또 적의 칼에 마음을 두면 그 칼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다. 우리 기예에 마음을 두면 그 기예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다. 적을 공격하려고 생각하면 그 생각하는 곳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다. 그리하여 마음을 배꼽에 밀어 넣고 다른 곳에 새지 않고 적에게 응해 변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의사가 병에 응하고 약을 주는 것 같은 것이다. 불법(仏法)의 향상에서도 내 몸에 더욱 미치고 전신에 펴고 넓히고 그 조업의 용무를 이루어 주는 것이다. 또 사안 분별하면 그 사안 분별로 마음을 빼앗기므로 무슨 일에도 마음을 한편에 정리하지 않게 한다.
양세(陽勢)는 유(柔)에 향해 음세(陰勢)는 거강(巨強)과 같이 가슴 속에 기술을 거둔다. 심신은 만사에 모두를 응하고 신성(信誠)을 행하면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이 갖추어진다. 그러므로 사계 오행이 이치에 합당하고 있으면 만물은 가득 차고 조용하다. 또 도리의 수행은 비전임으로 비밀로 전수된다. 이 때문에 안에서는 겨울의 하늘에 보름달이 비치도록 밖에서는 희미한 달과 같이 이 기술을 거두어 지(智)를 거둔다고 하고 기술을 거두고 지(智)를 비밀로 하는 것이다. 이것을 무도지인(武道至人)이라고 하는 것이다.
상대에게 이길 방법은 강유(剛柔)의 강약(强弱)이다. 강유(剛柔)의 강약(强弱)은 병법(兵法)의 지인(至人) 권화(權化)로부터 나왔다. 권(權)은 저울로 측정한다. 화(化)는 변함의 도리이다. 그 경중을 재고 기습과 정면 공격을 생각하는 것을 권화(權化)이다. 승리하는 것은 싸우기 전에 있다. 변함은 상대와 대결 하는데 있다. 권화(權化)의 근원은 틀림없이 굳셈을 부드러운 이치와 극치로 강(強)을 약(弱)으로 제압한다. 예를 들어 이빨은 강(剛)이지만 빨리 없어진다. 혀는 부드러운 본체를 가지고 있어서 평생토록 간다.
대체로 기예가 이르는 곳은 활물(活物)이 된다. 활물(活物)의 위치는 기록하기가 어렵다. 우선 유형(有形)을 사물 무형(無形)을 활물(活物)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른바 무술의 근본은 정법(定法)이 있으면 그래서 적(敵)을 제정한다. 그러므로 사물 도리의 수행을 쌓아 오지(奧旨)에 이른다. 그 근원을 찾으면 무술의 오지는 정확히 대극(大極)에 이르는 것이다. 대극(大極)의 원래는 이름도 없고 형태도 없다. 충한무승(沖漢無勝)이다. 이것을 대극(大極)이라고 하는 것이다.
주자(朱子)가 말하려면 대극(大極)은 형태보다 위의 길(道)이다. 음양은 형태보다 아래의 기량이다. 그 대극(大極)이 움직이고 양(陽)이 생기고 움직이지 않고 음(陰)이 생기는 것이다. 지금부터 오행사시만물(五行四時万物)이 생긴다는 것이다. 병법(兵法) 일의 집행은 음양의 이기(二気)이다. 지금부터 표리의 병제는 하도락서(河図洛書 : 음양도에 있어서의 역의 근본)이다. 또 도리의 수행은 무형이며, 지극의 도리는 대극(大極)이다. 대극(大極)은 활물이 되는 곳이며 병법(兵法)의 오의에 이르는 이치와 같다. 다음 편에서 계속 연재한다.
송일훈 박사(동아시아 무예전쟁사·문화교류정책 평론가)
전)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전)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소 연구교수
현)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소 전임연구원
[저작권자ⓒ 대구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