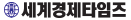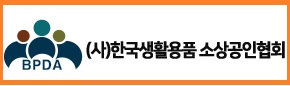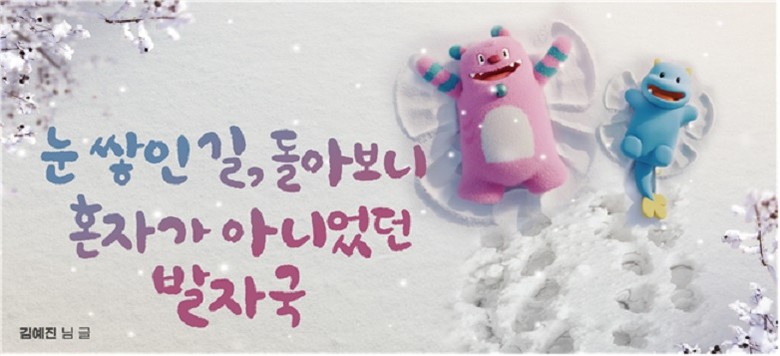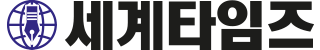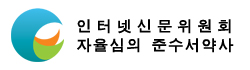|
| ▲ |
이에 대한 민주주의 발전인가 아니면 퇴보인가 논란이 있다. 왜냐하면 “청원”에는 좋은 내용이 많지만, 반대로 그 폐단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헌법이나 법률은 “청원”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다.
국회가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직접민주제를 내세워 행하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아주 위험할 수 있다. 히틀러 나치의 대중선동이나 공산주의의 인민재판으로 흐를 수 있다. 그러므로 직접민주제와 간접민주제는 오랫동안 헌법학자의 논쟁거리가 되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두 가지일 것이다. 하나는 권력이 대통령에 집중되어 대통령이 모든 국민의 청원이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다고 국민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국민을 눈높이로 일하지 못한 것은 간접민주제인 선거제도의 맹점일 수 있다. 선거를 통해 국민대표를 선출하는 것만으로 민주제가 완성하지 않는다. 국회의원 선거와 다음 선거의 사이의 4년 동안 국민은 정치에서 방관자로 전락한다. 물론 중간에 지방선거나 대통령선거가 있지만 정치는 주로 국회의원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촛불혁명 이후로 국회의 무책임과 무능 상태가 이것을 여실히 증명한다. 국회는 완전히 국민의 생각과 완전히 딴판으로 돌아가고 있다. 국회를 보면 국민은 짜증난다.
그렇다면 선거와 다음 선거 사이에 국민이 청치에 관여할 수 있는 민주제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활력이 넘치고 기능적인 민주제에서는 주권자 국민은 선거 후 4년 동안 방관자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능동적인 정치 주체가 되어 토론과 정치 의사형성에 참여한다.
그 참여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은 먼저 기본권 차원이다. 즉,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의 보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전적 민주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밖에도 행위능력이 박탈되거나 결정의 자유나 행동의 자유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질서 속에서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헌법은 입법부의 의결, 행정부의 정책결정,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국민은 항의, 청원, 이의제기, 참여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예컨대 “누구나 국가와 사회에서 민주적인 참가를 통해 자기의 이익을 지킬 권리를 가진다.”라는 헌법 규정의 도입이다. 이로써 국가와 사회 모든 분야에 누구나 참여하지는 못하겠지만, 많은 분야에서 국민이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예컨대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에는 전문위원 제도가 있다. 이들 전문위원은 특정 정당이나 기관의 추천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 전문가로서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이다. 사법부의 시민 참여재판 제도가 활성화도 포함된다. 정부는 지금보다 정제된 국민 참여 청원제도로 정책에 반영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국민 참여 원칙은 헌법이 규정하는 모든 공적 분야(기관, 단체, 정당, 학교, 대학, 요양시설 등)에서 민주화 요구와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더구나 이들 분야에 대한 정보공개와 공문서 열람권을 일반인에게 부여해야 한다. 참여, 정보의 공개와 열람은 아래서부터의 정치를 보장한다. 국민이 참여하는 아래서부터의 정치는 국회를 절차탁마시키는 무서운 채찍이 된다. 조규상 박사(재정경영연구원장)
[저작권자ⓒ 대구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