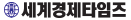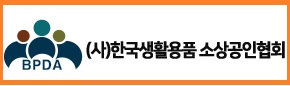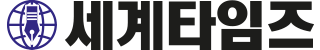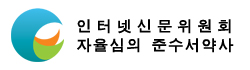|
| ▲ |
임진왜란 때 옥포해전을 비롯하여 사천해전, 한산도해전, 부산포해전에서 승리해서 조선바다 제해권을 장악하고 1593년 8월 1일 삼도수군통제사에 승진했다. 1597년 2월 26일 파면되어 3월 4일 구속이란 최악의 운명을 맞이했으나 다행이도 4월 1일 특사로 방면되어 권율의 휘하에 예속된 가운데 白衣從軍하였다. 8월 3일 남해연안을 순찰하던 주에 진주 운곡에서 통제사 복직 교서를 받았다. 1598년 8월 15일 鳴梁海戰에서 왜적을 대파하고 11월 18일 왜적이 철수하자 노량에서 왜적을 전멸 시킨 후 적의 유탄에 순국하였으나 아직까지 충무공 이순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진 사실은 없다(김영환, 「충무공 이순신의 해전과 호남인의 애국정신 -애국인사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정보학회, 2004).
이러한 그는 文과 武의 조화로운 함양을 위하여 學文과 무예의 修養에 心血을 기울이었다. 그는 서당에 다니면서 痛鑑 大學 등 어려운 서적을 읽으며 字句의 해석만 얽매이지 않고 大意에 통달하도록 유의했다. 또한 무사훈련에도 전념하였는데 특히 말을 타고 궁술 신체수양을 열심히 하였으며 또 각력상쟁의 격투무예를 병사들에게 장려했다. 또한 그는 유명한 명언을 남기도 하는데 “必死則生 必生則死”이다. 이러한 무예 수련에 있어서 제반 양상은 충무공 이순신을 능가하는 무사가 없었다(송일훈(2005), 충무공 이순신의 무예를 통해 이루어 낸 상무정신에 관해, 한국체육학회지, 44(6), 27-41).
그렇다면 당대 충무공 이순신의 궁술에 보이는 <신체수양論>에 앞서 현시대의 궁술 신체수양으로서의 의의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송일훈, 2006). 궁술은 身體的 뿐만 아니라 精神的으로도 궁술시에는 心, 氣, 技, 弓矢, 體가 渾然一體가 되어 無心의 경지에서 활을 쏘았을 때 비로소 명중되므로 精神一到를 궁술의 要諦라 할 수 있다. 즉 정신을 집중시킬 수 있는 능력, 자기 자신을 이기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 등이 배양되어 신체수양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射亭에 올라가 활을 쏘게 되면 선인들이 남긴 여러 가지 교훈 및 웃어른들과 벗들을 대할 때의 예법 등을 수양 할 수 있으므로 정서 함양과 인격 수양에 큰 도움이 된다. 궁술은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명중되지 않고, 명중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책하게 되는 까닭으로 해서 예로부터 이를 君子之道로 여겨 心身의 연마에 좋은 벗으로 삼아 왔으며 활쏘기는 禮와 德을 위해 행해 졌다. 이러한 당대 궁술의 예법으로는 正間拜禮, 初矢禮, 팔찌동, 同進同退, 궁술 9계훈 등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한국의 궁술, http://blog.naver.com/kyuchoel).
正間拜禮라 함은 正間의 위치에 예의를 표하는 것으로 正間은 射臺의 중간에 쓰여 있는 글씨로 한량은 처음 활터에 올라오면 여기에 대고 목례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正間의 위치에는 네모반듯한 나무에 '正間'이란 글자를 새겨서 현판처럼 걸어둔다. 또한 궁술에서는 남의 활터(亭)에 가서 正間拜禮를 하지 않을 경우 즉시 추방된다.
初矢禮란 활터에 올라가서 활을 처음 낼 때, 먼저 올라온 弓師들에게 취하는 예이다. 활을 왼쪽부터 시작하여 자기 자신의 차례가 되어 "활 배웁니다(활냅니다)"라고 하면, 다른 弓師들이 "많이 명중 하세요"라고 응수한다. 이런 初矢禮는 처음 올라와서 한 번 하면 된다. 다른 활터에 가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 예의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것은 활터에서 弓師선배들에 대한 예의뿐만 아니라 상호간의 예를 지켜야 하는 것이다. 사대에 서는 순서를 ‘팔찌동‘이라고 하는데, 활터는 예의를 중시하는 만큼 그 서는 자리를 정하는 것 역시 까다롭다. 이는 "활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팔찌에 놓인 한 덩어리의 질서를 팔찌동이라 한다. "팔찌동 위를 사양 한다"는 것은 남의 팔찌동 위를 서로 사양한다는 뜻이다.
사대에 서는 순서에도 禮儀凡節이 있다. 정간을 향해 섰을 때 가장 오른쪽이 가장 위쪽이며 과녁을 향해 서면 왼쪽이 가장 윗자리이다. 결국 활의 줌통을 쥔 줌손 쪽이 윗자리이다. 이는 겸양을 나타내기 위하여 윗자리를 양보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활터에서만 볼 수 있는 특수한 용어이면서 활터의 禮儀凡節을 잘 보여준다. 일단 한 순을 내기 시작했으면, 사대에서 쏘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지위가 높다고 해도 중간에 끼어들어서 활을 쏘지 못한다. 한 순을 다 낸(쏜)다음에 같이 사대에 나가서는 것이다. 이것을 同進同退라고 한다.
위에서 살펴보듯이 활 쏘는 弓師들이 지켜야 할 禮儀凡節을 예로부터 ‘弓術九戒訓’으로 정리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신체를 바르게 함은 그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2. 어질고 사랑하는 마음은 德行의 바탕이 된다. 3. 다른 사람에게 정성스러운 모습으로 겸손하게 대하라. 4. 자기 자신의 품위를 소중하게 하고 절개와 지조를 굳게 지켜라. 5. 안으로는 맑고 곧은 마음을 가지고 밖으로는 의기를 가져라. 6. 예의에 맞는 몸가짐을 엄숙하게 지켜라. 7. 활을 쏠 때에는 말을 삼가서 주변에 나쁜 영향을 주지 말며, 정신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라. 8. 승부를 겨룸에 있어 나를 이긴 사람을 원망하지 말라. 9. 나의 활이 아니면 다른 사람의 활을 쏘지 말라(正心正己 仁愛德行 誠實謙遜 自重節操 廉直果敢 禮儀嚴守 習射無言 不怨勝者 莫灣他弓).
‘弓術九戒訓’에서 정신적인 예의를 극도로 강조하는 이유는 궁시가 위험하며, 자칫 부상의 우려가 있는 만큼 조심스레 다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궁술은 활을 다루는 기술이다. 즉, 操弓을 하는 동작을 궁술이라 하는데, 실제로 궁술이란 藝, 技術, 學術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활을 쏜다는 것은 살을 과녁에 관중(적중)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일단 과녁에 대면한 이상, 어떠한 경우에도 살을 띄워서 과녁에 적중시켜야 한다. 방사란 사자가 就位하고 활을 擧弓하여 조준 후 화살을 과녁방향으로 쏘았을 때까지의 신체동작을 의미하는데, 이에 관한 방사 시 집궁제 원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대와 과녁의 높낮이를 꼼꼼히 살핀다. 그리고 바람의 방향을 살펴본다. 발은 정자도 팔자도 아니며, 어깨넓이 만큼 편하게 자연체 자세로 벌려 선다. 복식호흡을 실시하여 단전에 힘을 주어 다리에 고정시킨다. 줌손은 태산을 밀듯이 강하게 버틴다. 깍지 손은 호랑이 꼬리를 잡아당기는 마음으로 하며, 끌려가서는 안 된다. 이러한 자세에서도 과녁에 명중이 되지 않았으면, 자기 자신의 신체자세와 마음가짐을 다시 반성해야 한다(先察地形 後觀風勢 非丁非八 胸虛腹實 前推推山 後握虎尾 發而不中 反求諸己).
이처럼 충무공 이순신의 궁술의 신체수양에 대한 史料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친필초고본의 《亂中日記》이다. 《亂中日記》의 저자 충무공 이순신은 壬辰倭亂이 일어난 다음 달인 1592년(宣祖 25) 5월 1일부터 전사하기 한 달 전인 1598년 10월 7일까지 거의 매일 일기를 쓸 정도로 세심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었다. 이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쓴 것이 아니었으므로 본래는 이름이 없었으나, 1795년(正祖 19년)에 《李忠武公全書》를 편찬할 때 《亂中日記》라는 이름이 붙여져서 지금까지 불리고 있다. 충남 아산 현충사에 있는 친필 초고와 《李忠武公全書》에 실린 일기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많은데, 이것은 초고를 정자로 베껴 판각할 때 글의 내용을 많이 생략했기 때문인 듯하다. 《李忠武公全書》에는 실려 있으나 초고에는 없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亂中日記》의 전모를 알기 위해서는 친필 초고를 기준으로 하면서 《李忠武公全書》를 참고해야 한다. 엄격한 진중생활, 국정에 대한 솔직한 느낌, 전투 후의 기록, 수군 통제전술, 부하들에 대한 상벌, 가족, 친지, 부하, 내외 요인들의 내왕과 편지글 등도 실려 있어 壬辰倭亂 연구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일기라면 으레 있기 마련인 신변의 자질구레한 일이나 번민 같은 것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어머님을 그리워하고 부인을 생각하며 자식을 걱정한 것도 잘 나타나 있다. 壬辰倭亂의 전체 경과는 전해 듣고서 알았던 범위 내에서만 간단하게 씌어져 있고 사실을 밝히기 위한 방증을 끌어들이지 않았다. 다만 스스로 나서서 싸운 날의 전황은 자세히 적었는데, 이때도 해석과 평가는 내리지 않았다. 국보 제76호로 지정되었고, 충남 아산 현충사에 소장되어 있다(이은상, 《亂中日記》, 현암사, 1993).
그렇다면 충무공 이순신의 무예궁술에 관련된 기록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확인 할 수 있다(송일훈(2005), 충무공 이순신의 무예를 통해 이루어 낸 상무정신에 관해, 한국체육학회지, 44(6), 27-41). 첫 번째, 친필초고본의 《亂中日記》 계사 3월 15일, 16일, 17일 활을 쏘았다는 원문과 해석은 다음과 같다. 계사 3월 15일 경오 맑음. 우수사가 이곳에 왔다. 여러 장수들이 관덕정에서 활을 쏘는데, 우리 편 장수들이 이긴 것이 66분이었다. 우수사가 떡과 술을 만들어 가지고 왔다. 저물어서 비가 크게 쏟아지기 시작하여 밤새도록 왔다(癸巳 三月 十五日庚午 晴 右水伯到此 諸將射侯觀德 我諸將所勝六十六分 右水伯作餠酒而來 暮雨大作 終夜下注).
계사 3월 16일 신미 맑음. 여러 장수들이 또 활을 쏘는데, 또 우리 편 장수들이 이긴 것이 30여분이었다. 원 영공도 왔다가 매우 술에 취해가지고 돌아갔다. 낙안이 아침에 왔기에 古阜로 가는 편지를 주어 보냈다(癸巳 三月 十六日 辛未 晩晴 諸將等 又射侯 我諸將所勝三十餘分 元令公亦來 大醉而歸 樂安朝來 捧古阜簡而送).
계사 3월 17일 임신 맑음. 종일토록 큰 바람이 불었다. 우수사와 활을 쏘았다. 그가 아주 형편이 없으니 무장으로서 자질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무인으로서 창피한 일이다. 申景渙이 와서 임금의 분부를 가져온 宣傳官 蔡津, 安世傑이 본영에 왔다고 하였다. 그는 곧 돌아갔다(癸巳 三月 十七日壬申 晴 狂風終日 與右水伯射侯 不成模樣 可笑 申景潢來 傳宥旨宣傳官來營云 卽還送).
이날의 일기를 살펴보면 우수사와 활을 쏘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날 충무공 이순신은 ‘그의 궁술이 아주 형편이 없으니 무장으로서 자질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무인으로서 창피한 일이다’라고 기록하였다. 이 기록에서 드러나듯이 충무공 이순신은 무인으로서 무예 궁술을 못하는 장수들을 납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충무공 이순신은 무예 궁술을 통해서 부하장수와 병들을 경쟁시킴으로써 상무정신을 함양시켰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본인도 궁술 신체수양을 통해서 상무정신을 키웠는데, 이는 그가 아무리 지위가 높다고 해도 궁술을 못하면 지휘자로서 자질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두 번째, 친필초고본의 《亂中日記》 계사 5월 13일 원문과 해석은 다음과 같다. 계사 5월 13일 병인 맑음. 조그마한 산등 위에 소포를 치고 순천, 광양, 방답, 사도, 오후 그리고 발포 등 여러 장수들과 편을 갈라 활을 쏘아 시합을 하다가 都彦良이 와서 있다고 하였다. 이날 밤 달빛은 배위에 가득 차고 혼자 앉아서 생각을 하는데도, 나라 일에 온갖 근심걱정이 가슴을 치밀어 자려해도 잠이 오지 않다가 닭이 울어서야 어렴풋이 잠이 들었다(癸巳 五月 十三日丙寅 晴 食後小峰頂張帿 與順天 光陽 防踏 蛇渡及虞侯 鉢浦 分邊爭雄 日暮下船 夜聞嶺南右水使處宣傳官都彦良來云 是夕 海月滿船 獨坐轉展 百憂攻中 寢不能寐 鷄鳴假寐).
위 기록에 담긴 문장내용을 종합해 볼 때, 충무공 이순신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미리짐작 할 수 있다. 붓으로 문구 하나하나에 본인의 심정을 진솔하게 표현하여 본인 자신에 반성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한 걱정이 글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세 번째, 친필초고본의 《亂中日記》 갑오 9월 28일 원문과 해석은 다음과 같다. 갑오 9월 28일 계묘 흐림. 새벽에 불을 밝히고 홀로 앉아 적을 무찌르는 생각으로 兵法을 준비해 보았는데, 활이 살을 얻는 것과 같다는 것이었고(如弓得箭) 다시兵法을 생각하니 산이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다(如山不動). 바람이 고르지 못했다. 胸島안 바다에 진을 치고서 눈을 부칠 수 있었다(甲午 九月 二十八日 癸卯 陰 曉明燭獨坐 討賊卜吉 則初占 如弓得箭 再占 如山不動 風不順 陣于胸島 內洋宿).
위 세 가지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충무공 이순신이 궁술의 신체수양을 통해 兵法의 전략을 세웠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다. 친필초고본의 《亂中日記》에 기록에서 보이듯이 충무공 이순신은 바쁜 공무 중에도 활을 놓는 날이 거의 없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리고 왜적들이 침략을 감행한 순간 까지, 그는 책 읽는 것과 활 쏘는 것 그리고 일기 쓰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이처럼 충무공 이순신은 공무를 마친 후면 꼭 활터로 향하여 활을 쏘았으며 세찬 바람 앞에서도 결코 활쏘기를 멈추지 않았다. 나아가 그는 항상 切磋琢磨의 마음으로 활을 쏘며 심신을 수양하였다. 이러한 切磋琢磨의 마음은 그의 친필초고본의 《亂中日記》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러한 切磋琢磨의 마음을 담은 수행을 하였기에, 충무공 이순신은 단 한번도 壬辰倭亂에서 패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는 궁술의 신체수양을 통하여 거센 바람 앞에선 타오르는 등불과 같은 강인한 자아를 완성했던 것이다. 다음 편에서 계속 연재한다.
송일훈 박사(동아시아 무예전쟁사·문화교류정책 평론가)
전)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전)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소 연구교수
현)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소 전임연구원
[저작권자ⓒ 대구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