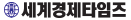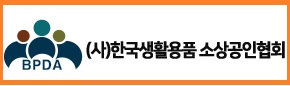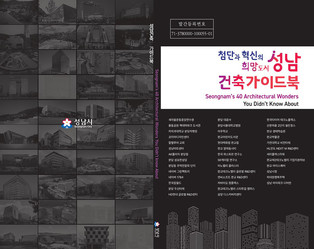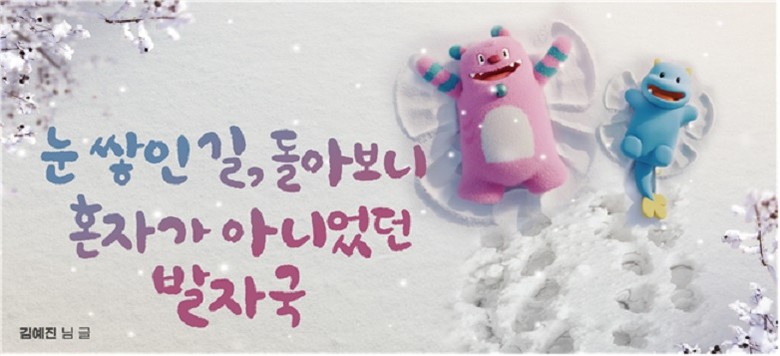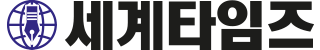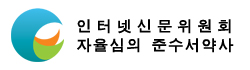|
| ▲ |
원래 유술이라 하는 것이 실제로는 그 근본이 ‘도(道)’가 있고 ‘술(術)’이란 오히려 그 응용이란 사실을 알게 된다. 그 가르침에는 먼저 도(道)로 시작하여 그 위에 응용의 술(術)을 지도하는 것이 바른 이치이다. 그러나 후꾸다(福田), 기(磯), 오꾸보(飯久保)의 3명에게는 쥬주쯔(柔術)란 명칭으로 가르침을 받았다(山本義泰(1987). 柔術の技法と思想. 天理時報社.) 전연 다른 무명으로 명칭을 변경시키는 것도 그러하거니와 그렇다 하여 ‘유(柔)’의 한 자만을 쓰기로 하여 유도로 명칭을 바꿔 사용한 듯하다(김상철(2000), 유도론. 교학연구사).
이러한 가노지고로(嘉納治五郎)는 1889년(明治 22년) 5월 대일본무덕회(大日本武德會)의 초청으로 ‘유도일반 및 그 교육상의 가치’에서 강도관(講道館) 유도가 종래의 고류 유술과 다른 점에 대해 술(術)을 도(道)로 바꾸어 승부법으로서의 유도, 체육법(體育法)으로서의 유도, 수심법(修心法)으로서의 유도 등의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이론화를 했다.
체육법(體育法)에 있어 그 목적은 “근육을 적절히 발달시킨다. 체신(體身)을 장건하게 하고, 힘을 기르며, 신체사지(身體四肢)의 작용을 자유자재로 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강(强), 건(健), 용(用)을 언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류유술의 기술 중 위험한 신체기법을 금지했다(藤堂良明(1997), 日本柔道の 過法, 現在, 未來. 第二回 大會抄錄集, 東北 ASIA 體育 SPORTS 史學會).
어이하든 유도를 창시한 가노지고로(嘉納治五郎)가 유도경기의 방법을 오직 일본의 여러 유술 유파의 장점에서만 창출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1930년에 공인된 레슬링 규정을 참고하기도 하였다. 강도관(講道館)의 자료실에는 가노지고로(嘉納治五郎)가 생전에 쓰던 메모를 전시하고 있다. 가노지고로(嘉納治五郎)가 친필로 깨끗하게 정서한 내용은 ‘레슬링심판규정’이라는 제목하에 북미합중국 아마추어 레슬링규정(1930공인)에 관한 경기장 설비규정과 선수의 복장 등에 관한 것이다.
강도관(講道館)의 자료실 전시자료들도 유도가 레슬링규정을 참고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것은 현대유도가 경기장과 선수복장 등에서 레슬링의 제규정을 참고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일본무덕회의 기능은 유도, 검도, 궁도 등의 이르기까지 일본무도를 정리하는 중추적 역할을 마련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형을 제정하여 ‘일본무덕회 제정형’을 명시화했는는데, 즉 이런 역할들은 당시 수많은 유파무술을 정리하는 크나큰 계기가 됐다(藤堂良明(1997), 日本柔道の 過法, 現在, 未來. 第二回 大會抄錄集, 東北 ASIA 體育 SPORTS 史學會).
당시 일본무덕회와 강도관(講道館)이 개별적 단체이기는 하나, 일본무덕회의 큰 단체의 협력단체의 역할을 한 것으로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일본무덕회 제정형’으로 인하여 현재 일본 각종 고무도는 격투 고류유술적 원형으로서 다양한 원리적 흐름과 신체기법이 사라져다는 것이 매우 아쉬운 점이다. 이 내용은 다음 칼럼에서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한다.
1911년에는 일본의 중학교에 “체조의 격검(검술), 유술은 부과할 수 있음(수의과)”이라 하여 정식과목으로 채택된다. 그리고 세계 제1차 대전을 전후하여 일본 국민의 상무적 기풍으로 1914년 제1회 전국고등전문학교 유도대회가 개최되었다. 그 이후 1930년에는 제1회 전일본유도 선사권(選士權)대회가 개최됐다. 또한 가노지고로(嘉納治五郎)는 해외의 유도보급을 위해 선수들을 이끌고 직접 한국, 중국, 유럽 등을 순방, 일본 유도를 세계에 소개하여 널리 보급하게 되었다.
이러한 그들은 1941년 태평양전쟁을 일으키면서 유도도 군사적 실전을 위한 훈련으로 변질되기도 했다. 그 이후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전으로 인해 무도(武道)라는 용어가 사용금지 되는 등 대단한 박해를 받게 됐으나, 경찰은 유도와 검도를 실시하여 그 전통을 이었다. 그리하여 학교 유도의 금지령해제를 원하는 소리가 높아지면서 1950년 학교유도가 부활되어 1951년 6월에는 전일본학생유도 연맹이 결성하게 된 원동력이 됐다. 현시대의 유도는 1964년 동경 올림픽으로 시작하여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신체문화 뿐만 아니라 선의경쟁을 통해 화합의 장 그리고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송일훈 박사(동아시아 무예전쟁사·문화교류정책 평론가)
전)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전)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소 연구교수
현)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소 전임연구원
[저작권자ⓒ 대구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