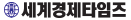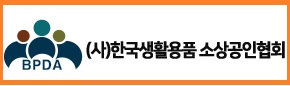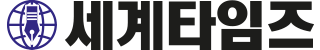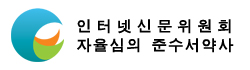|
| ▲신용우 행정학박사(지적학전공)/작가 |
지금까지 고조선의 나라 형태와 고조선이 우리민족인 한민족(韓民族)이 세우고 그 안에서 생활을 영유하며 살아온 나라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그 영역은 어떠했는지 알아보자. 그 영역을 아는 것이 만주에 대한 영토권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고조선의 경계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서쪽 경계다. 그 이유는 서쪽 경계야말로 중국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국경이기 때문이다.
신채호는 삼조선의 강역에 대해서 '조선상고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신조선’은 ‘ᄋᆞ스라’, 곧 지금의 하얼빈 완달산을 중심으로 봉천성의 서북과 동북, 길림·흑룡 두성과 연해주 남단 이었으며, 요동반도는 ‘불조선’, 압록강 이남은 ‘말조선’의 소유였다. 그중 개평현 동북의 안시고허에 도읍하고 있던, 서쪽에 위치한 불조선과 진(秦)나라가 국경을 정하면서 헌우락(軒芋濼) 이남의 연안 수백리 땅을 양국의 중립공지로 정하여 양국 백성들이 들어가서 사는 것을 금하니, '사기'에서 말한 바 고진공지(故秦空地)는 이것을 가리킨 것이다. '사기'와 '위략'에서 말하는 패수(浿水)는 헌우락이다.”
고조선의 서쪽 경계는 패수 즉 헌우락이라고 하면서 고대국가 사이에 있던 완충지대의 존재를 밝히고 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신채호가 말하는 헌우락이 지금의 어디를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해서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만주원류고'에서는 헌우락을 한우박(蓒芋泊)이라고 하며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원일통지' 한우박은 정료위(定遼衛)에 있다. '거란지지'에는 ‘패수(浿水)는 옛 니하(泥河)이다. 동쪽에서 역류하여 수백 리를 흘러 요양(遼陽)에 이르러 고여서 흐르지 않는다. 한우초(蓒芋草)가 호수(泊)에 자라기에 이름이 지어졌다.’고 하였다. '명통지'에서 니하는 일명 패수(浿水)로서 한우락(蓒芋濼)이라고도 하는데, 호수 안에 한우초(蓒芋草)가 많이 자라기에 이름이 지어졌다. "니하는 해성(海城)의 서남쪽 65리에 있다. 성수산(聖水山)에서 발원하여 미진산(米真山)에 이르러 흩어지며, 요나라 때에는 한우락이 되었으니 조선 경내에 있는 패강(浿江)이 아니다."
이처럼 패수 즉 헌우락은 한반도에 자리 잡은 강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다. 일시적으로 패수가 청천강이나 심지어는 대동강이라는 일제의 왜곡된 사학에 얽매인 때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다.
패수에 대해서는 북한학자들은 대릉하를 지칭하는 것이라는 학설을 내세웠고, 윤내현은 패수는 난하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위만이 투항해 왔을 때 기준왕이 패수 서쪽 중립공지를 내주어 그곳에 이주해온 조선의 옛 유민들과 연·제·조 유민들은 다스리게 하였다’고 한 것을 보면 패수는 대릉하라는 설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기록들을 보면 고조선의 서쪽 경계는 난하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조선은 중국의 연, 진(秦), 한 나라들과 역대로 인접하였다. '전국책'에는 연나라의 동쪽에 ‘조선 요동이 있었다’고 하였으며 '염철론' 험고편에서는 연나라의 동쪽 경계는 ‘갈석에 의하여 막히고 험한 골짜기에 절연되었으며 요수로 둘리었다’고 하였다. 여기에서의 요수는 오늘날의 난하를 지칭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기' 진시황 본기에서는, 진나라의 제 2대 임금의 명령에 따라서 대신이 갈석산에 세운 비석에 <시황제>라는 글을 새기고 돌아 온 것을 ‘요동에 갔다 왔다’고 썼는데 이것은 갈석산이 진나라 때 요동지방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갈석산은 난하 동쪽에 위치한 산이므로 요동과 요서의 기준은 난하를 경계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온성에서 갈석에 이르는 만리장성의 폐허에다 장성을 다시 복구하였다’고 한 '진서' 「당빈열전」의 기록은 3세기에 온성에서 갈석에 이르는 3000여 리의 진나라 때의 옛 장성을 복구한 사실을 전한 것으로 진나라 만리장성의 동쪽 끝이 갈석에 이르렀다는 것을 명백히 밝힌 것이다. '진서'보다 먼저 편찬된 '사기'「몽념열전」에서는 ‘임조에서 시작하여 요동에 이르는 만 여리의 장성을 쌓았다’고 쓰여 있으며 '한서'나 '위략'도 역시 진나라 장성이 ‘요동’에서 끝났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장성의 동쪽 끝이 갈석산이었다고 한 '진서'의 기록과 일치한다.
즉, 난하를 중심으로 요동과 요서를 구분했던 것이다.
따라서 고조선의 서쪽 경계는 난하를 기준으로 상류에서 시작하여 발해만에 이르는 하류에 와서는 갈석산으로 그 경계를 삼았으나, 난하와 대릉하 사이는 중립공지로 완충지대 역할을 했던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신용우 행정학박사(지적학전공)/작가/칼럼니스트/영토론 강사
[저작권자ⓒ 대구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