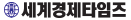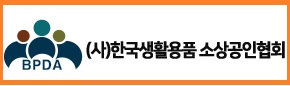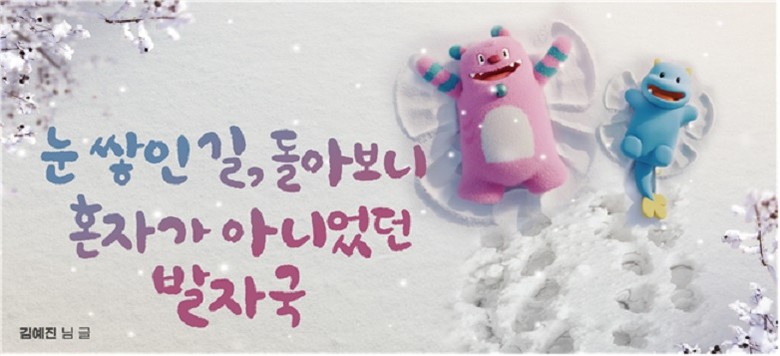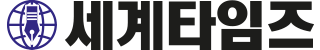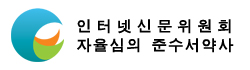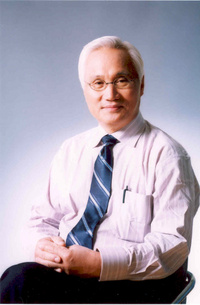 |
| ▲ |
우리는 통계학이 수학자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농업자들이 만든 것이라 한다면 믿겠습니까? 누구나 그것은 당연히 수학자들의 학문이라고 알고 있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어째든 협동조합은 농업을 일으키고 생산자가 유통을 직접하므로 신선하고 가격이 저가 안정 공급되는 특성이 오래 동안 존재하는 이유일 것이다.
제6차 농업정책도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제적 안정성을 꾀하려는데 있을 것으로, 우선 생산자가 6차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즉 과학농업을 인스마트 농업을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하여 먹거리 안정과 적정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숨어있는 것은 취활자들이 도시형 스마트농업 생산자로 직업을 유지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스타트업의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여 스마트농업 생산자로의 기틀을 잡는 것은 쌀 과잉생산을 축소하고 도시 취활자의 능력을 스마트농업 생산자로 농업성장 산업화로 안정된 먹거리의 적정생산과 공급으로 지역밀착형은 건강유지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3대 농민의 거대수입의 지역은 쌀을 생산하는 김포 쌀 농협들이 제일 소득이 높고, 제이는 성주참외 재배 농협, 세 번째는 화예를 재배하는 김해 농협이다. 개괄적으로 말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현상이다. 이러하듯 오래 동안 정착한 것은 소비자와 공급자간의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만 농협의 지원이 안정성과 경제적 이익을 함께 하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생산자가 개별적 협동조합을 조직해 신선한 먹거리 안정과 적정공급을 플랫트 홈을 통해 공개하여 자신이 농사를 짓는 것처럼 하므로 생산된 먹거리의 신뢰가 결국 적정한 공급으로 6차 농업의 틀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1농가가 생산하는 먹거리를 100~150가구와 협동조합회원을 구축하면 연배출이 1억 이상이 된다는 것은 계산 안 해도 그냥 알 수 있는 현상이다. 이런 협동조합이 미래 삶의 행복가치를 증진과 더불어 먹거리 안정성의 밀착 농업기반은 더 나아가 안정한 정치사회로 적정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먹거리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직된 협동조합은 결과적으로 삶의 질의 개선과 동시에 가치있는 삶의 만족도를 유지하게 되기 때문에 협동조합은 모든 면에서 조직이 4차 산업혁명사회의 기틀이 되어 제5차 산업혁명사회로 윤기 있게 건강한 협동사회가 미래가치를 형성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싶다.
이학박사 최무웅 건국대학교 명예교수, 땅물빛바람연구소대표, 세계타임즈 고문(mwchoi@konkuk.ac.kr)
[저작권자ⓒ 대구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