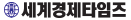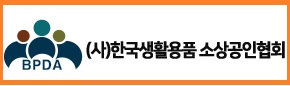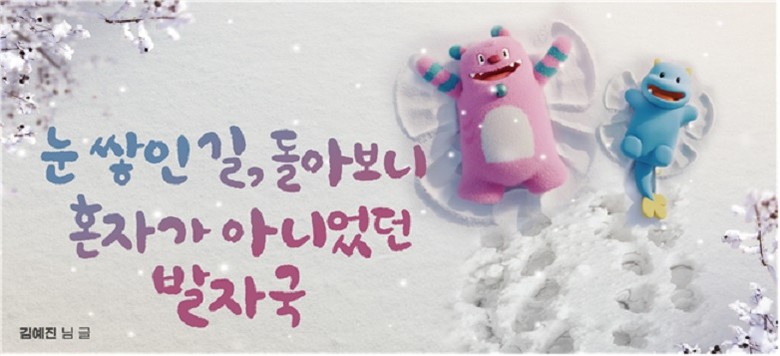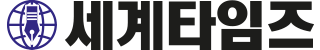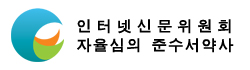|
| ▲ |
신라시대의 위대한 유산으로 화랑세기에 나타나는 ‘상무정신’과 ‘무사도’를 꼽을 수 있다. 이 위대한 유산을 바탕으로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우리민족의 초석이 되었으며 민족단일공동체 결집의 장이 됐다.
그렇다면 신라는 어떻게 상무와 무사도의 사상을 탄생시켰는가! 신라인들은 그들의 고유한 무도를 통해 무사들의 무사도를 완성시켜 왔다. 그것은 바로 화랑도라는 청소년 전사 집단의 무도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일본인들의 정신적, 육체적 기상은 어디서 어떻게 나온 것인가! 그들의 사상적 바탕은 바로 일본 문화 속에 뿌리 잡고 있는 사무라이(武士道) 정신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면 일본의 사무라이(武士道) 정신은 어떻게 탄생한 것인가!
일본 최초의 무사인 가마쿠라 막부(1198) 시기에 일본 천태종(天台宗)의 좌주(座主)였던 자원(慈圓)은 그의 저서 우관초(愚管抄)에서 무사를 일본어 발음인 무샤(ムサ)가 아니라 한국어의 발음 그대로인 무사라고 표기했다. 이에 대한 학설을 주장하는 대표적 학자로는 일본 사학자 다께우치(竹內理三)를 들 수 있다. 그가 언급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께다 가문에는 신라사부로(新羅三郞)라는 무사였다. 그는 신라사부로(新羅三郞)라는 성 썼는데, 원래 그의 본명은 미나모토(源)씨이다. 미나모토 요시미쓰는 본인의 성을 왜 신라사부로(新羅三郞)로 바꿔 쓴 것일까!
이는 일본 오미(近江)지방의 비와 호수변 도시 오쓰(大津)의 사찰 이이데라(三井寺)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미나모토 요시미쓰(源義光)는 자신이 『신라계도래인(新羅系渡來人)』임을 자랑하기 위하여 이름 앞에다가 신라삼랑(新羅三郞)이라 개명 하였는데(『주간동아』, 다께다 신겐 조상은 ‘미나모토(源)’라는 성을 썼는데, 미나모토 요시미쓰(源義光)는 신라명신(新羅明神)의 신라선신당(新羅善神堂) 앞에서 성인식을 치르고 성을 신라사부로(新羅三郞)로 바꿔 ‘신라사부로 요시미쓰’가 됐다).
특히 무사도라는 용어의 사용은 한국과 일본에서 전승되어 내려온 여러 『무도전서(武道傳書)』가 변천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상호보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그 시조인 신라시대의 화랑세기에 나타나는 무도의 도가 일본의 그것과 내용이 같다면 상무정신과 무사도는 신라에서 발생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무인들은 무도를 통해 인격을 형성시킨다는 보편적인 이념을 그 밑바탕에 깔고 있다. 우리는 화랑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분명히 우리의 무사도에 관한 기원에 대해 알아야 하며 이를 바로 정립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주체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일본의 무사도정신과 신라시대의 상무정신, 그리고 무사도의 기원에 관한 비고·분석을 통하여 그 사상적 의의를 밝히고 또 신라시대의 연결성을 찾아 그 전통성을 규명하고자 이번 칼럼에서 연재한다.
송일훈 박사(동아시아 무예전쟁사·문화교류정책 평론가)
전)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전)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소 연구교수
현)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소 전임연구원
[저작권자ⓒ 대구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